이 팬티는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책을 읽었다. 영문제목은 Where Underpants Come From – from checkout to cotton field travels through the new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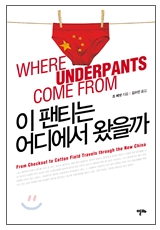
참고로 이 포스팅의 제목은 책의 뒷면에 나와 있는 글귀이다. 책의 내용을 잘 요약한 것 같아서, 원문을 이곳에 옮기자면;
지금 당신도 중국산 팬티를 입고 있지 않나요?
메이드 인 차이나 팬티는 어떻게 세계시장을 재패했을까
우루무치의 목화밭에서부터 팬티가 되어 할인매장, 계산대를 거쳐
우리손에 오기까지 팬티의 제조과정을 추적하며,
곧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느라 현재는 돌보지 않는 중국과
지극히 중국적인 중국인들을 만난다.
중국에 가보지 않고는 중국을 알 수 없다
중국이라는 곳은 우리 모두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다. 하지만, 막상 중국에 가서 살아본 사람은 누구나 ‘중국이 생각보다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된다. 책의 저자 조 베넷은 중국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 중국이라는 unique한 세상을 겪으면서 서구인으로서 느끼는 ‘색다른’ 정서들에 대해서 그의 감상을 적은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
왠만한 중국의 대도시의 인구는 뉴질랜드 수도의 인구의 서너배가 넘고, 중국의 생산, 운송, 수출 능력은 이미 전세계를 먹여살리고 있다. 이미 세계는 중국의 생산능력에 기대어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충칭의 인구가 3천만 가량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3천만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데, 사실 나는 충칭이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를 이 책의 저자는 여행에서 마주치는 사람, 자연, 건물 등등을 통해 정치, 문화, 역사, 경제, 언어, 무역구조 등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그의 암묵적 결론은 중화사상이다. 그들은 별로 외부로 나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어찌보면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그러나 인재들은 서비스업만 좋아한다?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모든 나라의 제품들이 자신들의 시장을 위해서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 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법도 하다.
대신에 미국인들은 제조업에 미련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 철강, 가전, 자동차 등 주요 경쟁상품들이 점점 아시아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본 이들은 더 이상 미련을 갖기 보다는 금융,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군사기술, 소프트웨어 같은 산업에 더 집중함으로써 더 고부가가치로 이행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근면’, ‘성실’ 문화에서 전국민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 한명이라도 넘어지면 뒤쳐지고마는 경쟁일변의 환경에 있는 우리는, 미국의 ‘고부가가치’, ‘스마트 경제’가 부럽기만 하다. 국민들에게 여유를 주고, 비전을 주고, 자부심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도 아닌 것 처럼 행동하면서 근면 성실을 울부짓는 이상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대나 자연과학을 학부에서 공부하는 것은 꺼리면서 금융이나 서비스업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GNP는 제조업에서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대부분 제조업체의 가치사슬의 끝에 간신히 한팔을 걸치고 있고,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갑’이 가지고 있는 근면 성실의 자세가 요구된다.
맺으며…
이 책은 책의 저자 조 베넷에게는 유쾌했던 여행을 기록한 책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읽으면 읽을 수록 한국의 어정쩡한 위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우울한 책이었다.
이 책의 말미에 작가가 신장의 목화 산지를 둘러보고 오면서 남기는 마지막 글로 이 포스팅을 맺으려고 한다. 중국에 대한 감상이 내 생각과 많이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아가씨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흠잡을 데 없는 영어실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반짝거림. 아이러니에 대한 자각. 높은 의식수준 때문이었다. 그 아가씨는 분명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중국인다운 면모를 지녔다. 멜버른에서 수학한 3년동안 친구를 거의 사귀지 않았고, 학위를 따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중국의 오지 마을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렇다.
이다 공장의 젊은 아가씨는 자신의 일과 회사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분명했다. 그 점도 전형적인 중국인의 특성이다. 중국에는 제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중국 대학들은 공학 및 과학 전공자들로 넘쳐난다. 그들은 졸업 후에 제조업으로 몰린다. 제조업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그 나이에 제조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 시절 많은 동시대인들이 그러했듯 나 역시도 제조업을 경멸했다. 그리고 고매한 일과 깨끗한 손톱을 동경했다. 내가 누리는 편안함과 특권이 국부에 달려 있으며, 국부란 물건의 발명과 제조와 판매를 통해 얻는다는 생각을 한번도 하지 못했다. 물론 수많은 정복과 약탈의 역사도 국부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나는 순진하면서도 타락한 인간이었다.
음울한 20세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타락할 기회가 없었다. 중국인들은 노동과 번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지했다. 현재 중국은 노동과 번영의 인과관계를 실험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실험을 즐기고 있다. 중국은 그 과정에서 자칭 ‘중화왕국’이라는 정당한 자리를 되찾고 전 세계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다 공장에서 젊은 아가씨를 만났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위구르인에 대한 경멸감이었다.인종차별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인종차별은 가장 추악한 죄악으로 꼽힌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다. 그러니 나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단지 나도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점만 밝히겠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중국인들을 불신했다. 중국인은 서양인과 다르게 생겼고,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며,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그게 전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결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이방인’들을 두려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인간이다. 인종차별은 진화적인 본능이다.
로마인들은 로마에서 멀어질 수록 털이 많고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산다고 믿었다. 역사적으로 중국인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피부가 매끈한 한족과 달리 외국의 야만인들은 털이 덥수룩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을 불신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외국인은 늘 골칫거리였다. 몽골은 중국을 정복했고, 영국도 중국을 정복했따. 그 후에는 일본이 침략했다. 중국은 외국의 침입에 고립주의로 대응해 큰 화를 불렀다. 하지만 중국이 점차 무역을 활성화하면 이방인에 대한 신뢰도 쌓여갈 것이다. 무수한 중국인들은 이 코쟁이 서양인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내게 웃음을 주었다. 나는 이곳이 좋다.
글 : MBA Blogger
출처 : http://mbablogger.net/?p=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