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판매학 (Selling Sickness) 이라는 책을 읽었다. 레이 모이니헌 이라는 호주 출신의 의학전문 기자와 앨런 커셀스라는 캐나다의 의학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고, 알마 라는 출판사에서 번역했다. (참고 : yes24 책 페이지)
정상의 범위를 좁히고, 아픈 사람의 범위를 늘리기
이 책에서는 제약회사가 어떻에 의사들과 연구소들을 후원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아프다고 믿도록’ 만드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사례별로 나와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약회사들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아프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약을 팔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소비자들이 많은 부작용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내용을 잘 요약한 국제적인 제약회사 머크의 CEO의 말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리글리 사의 껌처럼 보통의 건강한 사람에게도 우리 회사의 약을 파는 것, 그것이 나의 오랜 꿈입니다”
– 핸리 개스덴 (다국적 제약회사 머크 사의 CEO)
사람이 ‘의약품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아프다는 판단 기준은 애매하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면 아픈 것인가? 일상 생활에서 통증이나 불편을 느끼면 아픈 것인가? 아니면 전혀 불편함은 없지만, 의학적으로는 질병인 것인가? 누구나 몸이 너무 불편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들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정도면 별것도 아닌데, 왜 병원까지 왔나?’라는 듯이 대응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경험은 한두번쯤 있을 것이다. 혹은 반대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찾아간 병원에서 꼭 치료를 해야 한다며 당장 치료하자고 한 경험도 한두번은 있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질병의 기준인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처럼 애매한 기준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믿게 만들어서 매출을 올린다는 것이 이 책의 저자들의 주요 주장이다. 그 판매 전략도 다양한데,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이 목록이 사실상 이 책의 목차이다.
- 심장마비와 돌연사의 주범으로 몰아라|고콜레스테롤
- 정상 범위를 좁혀라|고혈압
- 젊은 여성을 새로운 위험군에 포함시켜라|골다공증
-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식 질환임을 강조하라|과민성 대장증후군
- 마음이 아니라 뇌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시켜라|우울증
- 모든 여성을 잠재적 고객으로 만들어라|월경 전 불쾌장애
- 정상적인 노화 과정도 질병이라고 믿게 하라|폐경
-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질병을 브랜드화하라|사회불안장애
- 환자와 그 가족들을 통해 병을 홍보하라|주의력 결핍장애
- 새로운 시작을 개척하라|여성 성기능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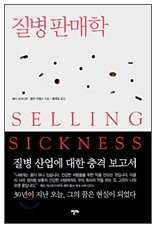
폐경이나 월경 전 불쾌장애와 같이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특히 남성들이 반론을 제기하기가 무척 어렵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 라면서 면박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
아무튼 그 외에도 수많은 케이스에서 ‘정상’의 범위를 좁혀서 때로는 전체 인구의 50% 가량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고가는 제약회사들의 수법 등이 이 책에는 많이 소개되어 있다.
결론: 우리는 아픈가? 아니면 외로운가?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도 사회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아픈 것이 아니라, 더 외로운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롭다는 말은 꼭 이성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뭔가 나의 고통과 아픔과 고된 삶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원한다는 뜻이다.
힘든 삶의 가운데에서 우울하고, 불쾌하고, 과민하고, 주의력을 기울이기 힘들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것은 당신에게 병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치료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상태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1) 내가 아프다고? 웃기지마! 나는 건강해.
2) 그래? 어쩐지 나는 많이 힘들더라.. 역시 나에게는 병이 있을 정도로 나는 힘든 상태였어.
그 중에서 두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에게 의사들이 친절하게 약을 건네고 처방을 해 주면, 우리는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은 아닐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제약회사의 커뮤니케이션에 넘어가는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여린것 같다. 예컨대 어린아이기 넘어졌을 때, 부모가 옆에서 괜찮다고 부추기면, 아이는 괜찮은줄 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 중에는 엄마가 봐주기를 바라면서 일부러 더 엉엉 울어대는 아이들도 있다. 아마도 후자와 같은 응석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금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제약회사+(일부)의사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가지 고무적인 일은 미국이나 캐나다를 중심으로 제약회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젊은 의사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 즉, 의대에 진학하는 시절부터 제약회사로의 금전적/비금전적 도움을 일체 거부하는 집단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아무래도 사람이라면 무언가 혜택을 받게 되면, 무의식적으로라도 나에게 혜택을 준 사람을 도와주기 마련이므로, 애초에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행동이다.
우리는 아픈 것일까? 혹은 아프기를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외롭고 힘든 것일까?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글 : MBA Blogger
출처 : http://mbablogger.net/?p=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