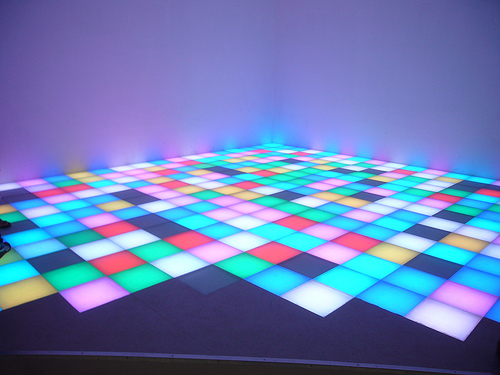
아래 이야기는 국내 모 대기업에서 실재로 있었던 일이다.
모 기업의 회장님이 경영진과의 장시간의 회의 끝에 ‘자,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회의가 끝났다. 회의가 끝나고 다들 점심 식사 약속이 잡혀 있어서 모두 점심을 먹으러 함께 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 회의는 녹취되는 회의였다. 그 기업에서 일하는 다양한 계층의 종업원들에게 회의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녹취 파일을 들은 직원들은 그 ‘갑시다’ 라는 말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회장님이 동의했다는 뜻인지’를 놓고 한참을 설왕설래 하면서 싸웠다.
한마디로 애매한 상황이며, resource들이 낭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MBA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GMAT 시험의 Verbal 파트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도 또한 구체성이다. 즉,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A가 읽을 때는 ‘가’라는 뜻이 되고, B가 읽을 때는 ‘나’가 되어서는 안된다.우리 회사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회사에서 다큐먼트에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라고 교육을 받고,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challenge 받는다.
예컨대 재무제표에서 매출이 100억이라고 하면, 그 100억이 무슨 뜻인지를 주석사항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매출을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잘 매출이 잡혔는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서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아무튼 절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최소화되도록 한다는데 포인트가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항상 두루뭉실하게 말하고 싶게 만드는 많은 유혹이 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추상적으로 말하면 학구적으로 보이거나, 고상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앞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경우와 반대로 상대방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에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고 공격하는 사람과 너무 구체적이라고 공격하는 사람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두루뭉실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받을 때에 한번 더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되는 반면,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그것을 변호할 기회를 상실할 때가 많다. 그 자체로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막말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래서일까 정치인들은 두루뭉실하게 말한다. 항상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둔다.
Q: 전당대회에서 출마를 하시는겁니까?
A: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Q: 출마를 한다는 것입니까?
A: 출마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권자분들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바로 오늘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정치인과 사회자 간에 실제로 있었던 인터뷰다.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는 정치인은 일단 경계 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내용과 항상 다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구체성은 ‘신뢰’를 낳을 수 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비즈니스의 발달이 세상을 더 삭막하게 만든 것 같지만, 오히려 신뢰의 수준은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
우리는 처음 가보는 상점에서 ‘신용카드’ 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상점에서 몇십만원에 달하는 상품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물건을 보낼 수도 있으며, 일단 물건을 받고 다음달에 돈을 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낸 ‘신뢰’라는 바탕위에 모두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그 신뢰가 인간간의 신뢰라기 보다는 그 신뢰를 제도화(institutionalize) 한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비즈니스 세계의 신뢰의 이면에는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되어 있고, 그 계약의 특징은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갑’은 누구며, ‘을’은 누구인지가 명시되어 있고, 돈은 언제 받아서 언제 갚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고도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매번 우리가 계약을 맺을때마다 계약석를 확인하지 않아도 될 때도 많다. 모든 것이 ‘신뢰’위에 구축되어 있다.
비즈니스의 논리를 정치에 대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최근 몇년간 몇몇 사람들이 몸소 증명했으므로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항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세를 이 시대의 정치 세계에 좀 더 적용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리더십에서 말하는 내용을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 또한 완벽하게 그 의도와 같게 수행하려면,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정부심판’, ‘철저한 조사’ 같은 애매모호한 구호들을 듣고 있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이면에는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도록 해석하고자 하는 고도의 암호화 전술이 숨겨져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구호들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 스스로가 그 애매함의 포로가 될 때이다. 즉, 자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구호를 나열하는 사람은 일단 극도로 경계하고, 절대로 신뢰하여서는 안된다. 신뢰하면 안될 뿐 아니라 지지를 보내고, 지원금을 주고, 표를 주는 등의 행동을 해서도 안된다. 한번에 정치판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주어서 구체적인 표현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고, 여러번 고려해 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우리 주변의 정치인들을 볼 때 구체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자.
구체적일 수록 신뢰할 수 있다.
글 : mbablogger
출처 : http://mbablogger.net/?p=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