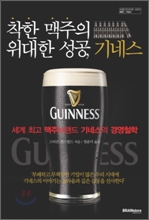
기네스 맥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맥주중에 하나이다. 미국에 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에일에 눈을 뜨면서 기네스의 맛이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그래도 여전히 기네스는 내 입맛에 맞다.
얼마전에 맥주 공방에 브루잉을 하러 갔다가 책장에 꽂혀 있는 기네스 맥주에 대한 책이 있어서 집어들었다. 한번 맥주 브루잉을 하려면 6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브루잉을 하면서 틈틈이 이 책을 읽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포스팅의 제목과도 같이 ‘기네스는 정말 훌륭한 회사였구나’ 라는 점을 알게되었다. 술 만드는 회사가 훌륭한 회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로 들려서 나도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책을 읽었는데, 술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을 조금만 꺼 놓은 다음에 기네스의 스토리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다. 어쩌면 내가 요즘 맥주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기네스 정도의 술은 애교로 보였을지도…
Built To Last
일단 기네스 가문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기네스 병에도 항상 들어 있는 ‘Arthur Guinness’라는 사인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그것이 바로 기네스 맥주 회사의 창립자인 아더 기네스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도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맥주의 레시피를 활용해서 1759년 더블린에서 처음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여기서 그가 한 공장터를 발견하고 그곳에 기네스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 공장과의 리스 계약이 무려 900년이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900년이라는 시간을 보면, 단순히 그가 하루이틀 장사를 하려고 회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수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1년에 한번씩 Arthur Guinness Day라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행사는 아더 기네스를 기리기 위한 행사라고 한다. 이 때는 유명 뮤지션들을 불러서 파티도 하고, 아주 재미있는 행사가 많이 펼쳐지는 모양이다. 캠페인 영상이 있어서 공유하려고 한다.
기네스 가문의 ‘자녀 포트폴리오’에서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더 기네스가 기네스 맥주 회사를 차린 후에 몇대에 걸쳐서 기네스 맥주회사는 번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들 각자의 역할이 아주 대단하다. 예를 들면, 자식이 8-9명 정도 있으면, 2-3명은 회사 경영을 이어받고, 2-3명은 더블린(도시) 혹은 아일랜드(국가)의 정치가가 되고, 나머지 2-3명은 성직가가 되는 것이다. 사업가, 정치가, 성직자의 완벽한 자녀 포트폴리오!
그래서일까? 기네스는 1800년대부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대단한 수준의 사회적 기업이었던것 같다. 예컨대 기네스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2파인트의 맥주를 무료로 나눠준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당시의 시대상황으로서는 하루 2파인트의 맥주는 아주 귀중한 식량이었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나도 여러 회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직원들에게 풍족하게 나눠주느냐 아니면 굉장히 짜게 구느냐는 직원들의 사기에 매우 큰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 밖에도 기네스는 나중에 기업이 커지고 나서는 기업내에 의료진을 항시 두어서 직원들이나 직원들의 가족들에 대한 치료를 모두 기업 내에서 해결해 준다. 단순히 병원을 설립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의료기기와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해서 종업원들에게 아일랜드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1800년대 중반에 이러한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의 복지개선 담당자가 이미 직원들의 가정을 모두 방문해서 가정 환경이 열악한 직원들을 모두 조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직접 집을 지어서 그들이 이주해서 살도록 배려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밖에도 기네스 맥주의 수출 전략이나,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맛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제국주의 시대에도 전세계에 영업사원을 파견해서 기네스의 세일즈에 주력하는 한편, 수출 과정에서 병이 깨지지는 않는지 등을 조사한 자세한 메모가 소개된다. 이런 내용은 지금 봐도 아주 놀라운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모두 알고 있는 기네스북(The book of Guinness)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기네스를 마케팅하게 되었는지도 자세하게 나온다. 그리고 1900년대 초반 광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기네스의 다양한 마케팅사례들도 소개되므로,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역사교과서’같은 의미로 참고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이 책의 번역은 그다지 훌륭한 편은 아니라서 1930년대 미국에서 시행된 ‘The Prohibition’ 같은 단어를 ‘금주령’으로 번역하지 않고, 맥주 브랜드로 오인하고 있다. 전문 번역가가 한 것은 아닌듯 해서 조금 눈에 거슬린다)\
사회적 기업은 멀리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기네스는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설립자를 비롯한 경영진들의 사회와 직원에 대한 배려가 자리잡고 있다. 지금은 디아지오라는 글로벌 컴퍼니의 한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어서 과거에 그렇게 따뜻하게 운영되던 기네스 브랜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리고 이 책은 기네스를 띄워주기 위한 책이고, 그 과정에서 우호적으로 기술된 부분이 없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1800-1900년대 중반까지도 이렇게 훌륭한 사회적 기업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동안 경영학을 오래 공부해온 나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영국이나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 수백년간 지속된 기업을 볼 때면 가끔 그들의 문화속에 ‘기업’이라는 것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과 종업원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강하게 녹아있는채로 발전했음을 볼 때마다 나는 매우 놀라게 된다. 예컨대, 우리가 어릴적 위인전에서만 보던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가이기도 하지만 GE의 창업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처음 알고 놀랐듯이, 그리고 기네스북이 맥주회사 기네스에서 영국 사람들에게 새롭고 신기한 통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무료로 배포했던 책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고 놀랐듯이, 이들은 모두 그 태생에 ‘돈좀 벌어보자’는 식의 목적의식은 강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언제부터 우리 주변에는 ‘돈좀 벌어보자’는 의도로 가득찬 기업들만 우글거리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소비자들과 종업원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에 매진할 때 더 많이 발전했음을 보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그리 멀리 있지 않았음을 생각해본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기네스의 Made of More 캠페인의 광고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광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차별화 포인트를 잘 잡아낸’ 광고인데, 전부 다 보시기에 지루할 수 있으나, 마지막에 나오는 구름거품의 비주얼을 보면 약간 소름이 끼친다. 광고 에이전시인 BBDO에서 구름거품 비주얼을 아주 환상적으로 잡아냈다.
글: MBA Blogger
출처 : http://mbablogger.net/?p=5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