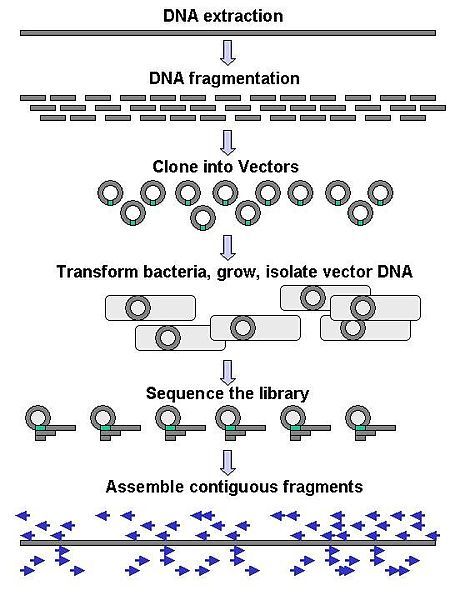
그런데, 사람들이 유전자와 관련한 이런 변화를 반드시 반기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사이언스 Translational Medicine의 온라인판에 지난 4월에 출판된 “Whole-genome testing is not a crystal ball,” 이라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자들의 논문에 따르면 이런 유전자들의 특정 질병과의 연계성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특별히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에 비해 별로 나을 점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흔한 질병들은 환경이나 생활습관과 같은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유용성은 더욱 떨어진다. 이들은 수만 명의 일란성 쌍동이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암, 자가면역질환과 심장 및 신경과 질환 중에서 흔한 24가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전자 정보가 없더라도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모아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90% 정도는 자신들의 생활습관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의학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저위험(low-risk)”으로 나왔다고 할 지라도 해당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되려 이들에게 잘못된 신념을 심어준다면 건강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연결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자신의 유전자가 특정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해서 과거에 과도하게 걱정을 했던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효과도 있는데, 특히 알쯔하이머 병 등의 가족력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물론 전체 유전자를 저렴한 가격에 검사해서 알 수 있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유용성을 검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듯 싶다. 아직 우리는 질병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 대부분의 질병들은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실제로 해당 질병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은 환경과 생활습관 등에서 결정되는 요인이 훨씬 크다.
어쩌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 이상으로 비유전적인 요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질병진단 및 모니터링, 관리모델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진단이 되고 항암제에 대한 감수성 등을 결정하는 등의 일부 케이스에는 개인이나 조직의 전체적인 유전자 검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홍보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되려 무엇을 먹고, 어떤 종류의 발암성 물질에 자주 접촉하게 되는지 알 수 있으며, 가족력 등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개인의 의무기록을 잘 관리해서 연결짓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건강기록이나 최근 보급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강습관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것에 더 많은 아이디어와 대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자료:
How Useful Is Whole Genome Sequencing to Predict Disease?
Study Hints at the Limits of Medical Genomics
글 : 정지훈
출처 : http://health20.kr/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