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의 마지막 주에 읽기에 썩 밝은 분위기의 책은 아니었으나, 12월에 대대적인 마케팅이 되었던 책인지라, 나도 흥미에 이끌려서 이 책을 사 보게 되었다. ‘예일대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라는 selling line과 ‘죽음’이라는 토픽은 너무 흥미로웠기에 서점에서 이 책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기가 매우 힘들었다. 이 죽일 놈의 호기심…
(note – 이렇게 어려운 책이 우리나라에서 best seller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얼마나 마케팅에 좌우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래에서 보듯이 미국판 책의 읽고 싶지 않은 비마케팅적인 표지에서 한글판의 예일대학의 강의스러운 표지로의 전환도 마케팅의 성공이라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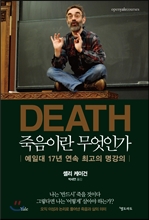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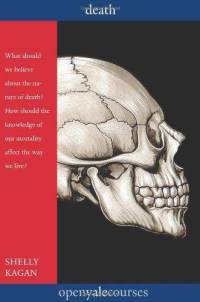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 책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흥미로운 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애초에 내가 이 책을 사면서 기대했던 바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고찰, 그리고 동/서양에서의 죽음을 바라보는 종교적/문화적 차이, 그리고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 등이 나온 책일 것이라는 기대였다.
나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이 책은 철저하게 논리학, 혹은 논리 철학에 관한 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 책에서 (논리적으로) 다뤄지는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죽음이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인가?
- 여기서 죽음이 무언가가 끝나는 것이라면, 과연 끝나는 ‘무엇’은 도대체 무엇인가?
- 죽음을 맞이하는 대상은 육체인가, 인격인가, 영혼인가?
- 죽음을 맞는 주체는 ‘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다시 육체인지, 영혼인지, 인격인지)
- 죽음이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나쁜 것인 것일까? 그렇다면 삶의 가치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 자살은 합리적인 선택인가? 도덕적인 선택인가? 둘 다 일수 있는가? 등등
다시 한번 밝혀두지만, 이 책은 위의 질문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기 보다는 저자 (셸리 케이건)이 방 안에 조용히 앉아서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의 Justice 라는 책의 성공 탓인지,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며 질문의 형식으로 한글 제목을 정했지만, 원래 제목은 그냥 Death 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의 교양 수업들이 그러하듯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시대부터 내려오는 ‘문답법’의 전통에 따라서, 이 책 또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해 봐야만 할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는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동양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답을 명쾌하게 내려주지 않는 수업방식, 책의 저술방식이 처음에는 굉장히 짜증스럽게 느껴진다. (나 또한 그랬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책은 우리 뇌의 이곳 저곳을 콕콕 찔러서 생각을 provoke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교양학부의 많은 교수들이 답을 내리기 보다는 이런 provoking 하는 방식의 교수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러한 교육 방식이 쉽게 답을 가르쳐 주는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책은 논리에 대한 기초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한번 조용하게 앉아서 logic tree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기에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억지로 비즈니스와 연관된 효용성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로직 훈련이 비즈니스에서는 꽤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흔히 바바라 민토의 피라미드 이론을 비즈니스 논리의 연습서로 많이 활용하는데, 이 책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에게는 이 책의 중간 부분에 자신이 암에 걸려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자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이 학생의 이야기는 이 책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에 등장할 뿐이다) 그 학생의 이야기는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데, 우리 모두가 만약 나에게 암 선고가 내려져서 인생이 1-2년 밖에 남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 것인 것? 와 같은 시나리오를 한번쯤 생각해 봤을 것이다. 이 학생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대목이다. 길지 않은 내용이라서 직접 옮긴다.
여러분에게 1년 또는 2년의 시간밖에 주어져 있지 않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공부, 여행, 아니면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와 관련한 감동적인 사례가 바로 예일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죽음 강의에서 있었다. 몇 년 전 정말로 죽어가는 한 학생이 내 강의를 신청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학생은 이미 1학년때 암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담당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기껏해야 몇 년 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 때, 그 학생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학교를 졸업하는 일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죽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이다. 그렇게 그 학생은 졸업반 2학기에 죽음에 관한 내 강의를 수강하게 됐다. 그런 상황에 처한 학생이 내 수업에 참석하고, 그때마다 나를 깨어 있게 만들고, 영혼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지, 우리 모두 죽을 거라는 사실이 과연 나쁜 것인지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나를 숙연하게 했다.
그렇게 그 학생은 봄방학 전까지 내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봄방학 동안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고, 의사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당부했다. 그렇게 그 학생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후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나를 포함해 당시 그 학생이 수강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던 교수들이 모여 행정상의 절차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학점을 어떻게 줘야 할까? 당연히 그 점수에 따라 졸업 여부가 결정될 터였다. 다행히 그때까지 그 학생의 성적은 좋았다. 결국 예일대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교무책임자를 그의 고향으로 내려 보냈다.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선택할까? 나라면 솔직히 모르겠다.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가?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알게 된다면, 정말로 원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될까?”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질문이다. 죽음에 관한 예측 불가능성은 죽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좋은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
글 : MBA Blogger
출처 : http://mbablogger.net/?p=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