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정신의 방의 시청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드라마는 평범한 스타트업과 평범한 아이디어의 6개월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180일을 정주행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채널 고정, On 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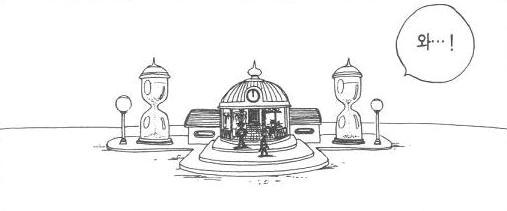
Scene1. 대박의 꿈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업계획서를 쓰는 일이었다. 창업자금을 확보하고, 사무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사업이나 민간의 인큐베이팅 사업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력 3년차의 사원급이었기에 당.연.히 제대로된 사업계획서는 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었다. 양식은 많았지만 샘플은 없었다. 자기소개서 한 장도 샘플 없이는 쓰기가 어려운게 현실인데, 인터넷에서 찾은 사업계획서는 대기업에서 작성한 수십장에 달하는 것들 뿐이었다. 죄다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같은 숫자단위가 다른 사업들이 대부분이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앱비즈니스에 대해 고작 5장-10장짜리 사업계획서 쓰는데 보름을 뜬 눈으로 보냈다.
앱개발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지만 최근 데이터에만 빠삭할 뿐, 최초 데이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몰랐다. 시장 진입은 어떻게 하는지, 고객타겟은 어떻게 정하는지, 어떻게 해야 노출이 되고 인지도를 쌓게 되는지 모른고 있다는 것을 목차만 나열된 사업계획서를 보고서야 깨달았달까.
어쩔 수 없이 최신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시작했다. 매일 앱스토어 랭킹 상위에 있기만 하면, 1년 쯤 뒤에는 유처가 몇 백만이 넘고 매출도 수억원에 달했다. 보수적인 숫자로 잡았다고 생각했음에도, 미래는 장미빛이었다. 그 때 만큼은 기분이 좋았다. 목표달성 못하면 어때, 반이라도(무슨 근거로?) 되면 좋겠다!
Scene2. 쪽박의 현실
신나게 꿈에 부풀어 개발하고 앱을 런칭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인들을 동원해 30-40개를 받으니 순식간에 순위를 치고 올라갔다. ‘이게 아닌데?’
iOS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비슷하거나 더 좋은 앱들도 많았으며, 노출될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다. 사용자들이 선택하는 앱의 개수는 줄어들었거니와 매일 뻔한 아이템들이 랭킹을 점령하니 앱스토어 자체를 들어가보질 않았다. 아이폰 3GS을 처음 만지던 시절의 나를 돌이켜보면 매일 앱스토어 구경하는 재미에 빠져있었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정도 들어가보는 수준이었다. 업으로 삼는 사람조차도 이러는데, 일반 사용자는 어땠을까.
다운로드만 받는 앱을 파는 것으로 비즈니스를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개의 앱을 출시하고, 2-3개의 앱을 더 개발하면서도 진심으로 진지하게 고민했다. ‘회사, 접을까?’
회사를 나오고, 스타트업이라는 명찰을 단지 딱 1년이었다.
Scene3. 못 먹어도 ‘고’
고스톱(Go-Stop)은 일정한 점수에 이르면 ‘났다’고 하며, “고” 또는 “스톱”을 외침에 따라서 놀이의 승패가 결정되거나, 한 번씩의 차례가 더 돌아가는 게임이다.
내가 여기서 스톱하면 약간의 빚을 가진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경력직으로 취직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보낸, 끝나버린 느낌이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았다. 어디가서 스타트업했다고 말도 못꺼낼 것 같았다.
다섯이었던 팀원들은 흩어진지오래고, 나와 한 명 남은 코파운더만 남아 얘기했다. 계속 할 것인지, 그리고 같이 할 것인지. 포기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나는 코파운더가 함께 안한다고 하면 굳이 고집부릴 이유도 없었다. 마음 맞는 팀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창업동기였으니까.
긴 대화 끝에 딱 한번만 더 해보기로 했다. 이 한번에 모든 걸 걸어보고, 그래도 안되면 아직 사업할 짬이 안되는거니 깔끔하게 포기하자고 했다. 6개월이었다. 6개월안에 개발이 안되고, 올해 안에 서비스가 자리잡지 못하면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다. 스타트업 2년의 빚을 짊어지고 사회로 돌아가면 최소 5년 동안 저축을 포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원 고! 올해 말까지만 해보자!”
Scene4. 앱의 무덤
보통 ‘생산성’ 카테고리는 앱의 무덤으로 불린다. 애플이나 구글이 짜잔! 하고 기본 기능으로 추가해버리면 수십개의 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후면라이트를 이용해 후레시 기능을 만들었던 앱들도, 정식지원된 이후로 아무도 받지 않게되는, 뭐, 그런식이다.
그래서 내가 컨텐츠 서비스를 하느냐, 자신 없었다.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인지 겪어봤기 때문에 혼자선 절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오늘 올리면 내일 돈이 된다는 소셜커머스도 마음에 차지 않았다. 다들 핫하다고 하지만, 영업을 하며 사장님들을 꼬실 능력이 없었다.
할 줄 아는 것, 하고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이 세개의 기준으로 놓고 아이템을 골랐다. 할 줄 아는 것은 생산성과 유틸리티고, 하고 있는 것도 생산성과 유틸리티고, 하고 싶은 것도 생산성과 유틸리티였다. 그 세가지 기준의 앞에 ‘잘’이라는 단어를 붙여보았다. 잘했던 것, 잘 하는 것, 잘 하고 싶은 것.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투 고! 그냥 하던거 하자고.”
힘든 싸움이 시작됐다.
글 : 강미경
출처 : http://minieetea.com/2014/07/archives/2016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